1. 서론
제2언어습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성 전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제1언어의 어떤 특징이 제2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제1언어 간섭 효과(first language interference effect)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한 제2언어의 어떠한 음성 특징이 반대로 학습자의 제1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제2언어의 간섭 효과(second language effect on first language)이다. 과거 제2언어습득 분야에서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지난 성인의 제1언어는 화석처럼 굳어져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그동안 전자의 주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후자에 관한 연구는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Weinreich(1953:1)가 언어접촉 상황에서 양방향성(bi-directional) 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제2언어에 의한 역방향성 전이(reverse transfer) 효과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음성 실험을 통해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Flege와 Major 등이 있다. Flege(1987)은 영어와 프랑스어 무성파열음 /t/의 산출 실험에서 제2언어에 의한 제1언어의 음향적 편차(L1 acoustic deviation)를 발견하였다. 연구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미국에서 거주하는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제1언어와 제2언어 무성파열음 /t/에 대한 VOT(voice onset time)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영어 /t/는 VOT가 단일언어자보다 짧아졌고, 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프랑스어 /t/는 오히려 단일언어자보다 길어졌다. 영어의 /t/는 프랑스어 /t/보다 더 긴 VOT를 가지는데, 이러한 차이가 프랑스인과 미국인의 제1언어에 영향을 준 것이다. Major(1992)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파열음 VOT를 조사하였는데, 미국인 학습자의 파열음 VOT가 단일언어자보다 짧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브라질 포루투갈어의 파열음 VOT(약 20 ms)는 영어(약 85 ms)에 비해 상당히 짧은데, Major는 이 차이가 미국인의 모국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Pavlenko(2000:179)는 선행연구의 실증적 증거를 토대로 제1언어의 음향적 편차가 출현하는 양상을 차용 전이(borrowng transfe), 수렴(convergence), 전이(shift), 구조 재구성 전이(restructuring transfer), 모국어 소모(L1 attrition)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후 제1언어에 대한 제2언어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서구 국가의 언어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었다. 주요 연구로는 제1언어 영어와 제2언어 스페인어(Huffman & Schuhmann, 2015; Lord, 2008), 제1언어 영어와 제2언어 독일어(Ulbrich & Ordin, 2014), 제1언어 영어와 제2언어 러시아어(Pavlenko, 2003), 제1언어 케추아어와 제2언어 스페인어(Guion, 2003), 제1언어 독일어와 제2언어 영어(Leeuw et al., 2010) 등이 있다.
서구 언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언어를 대상으로 발표된 연구는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표준중국어(Mandarin Chinese)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이론을 소개한 것이고, 소수의 실증적 연구는 영어와의 상호작용을 다룬다(Jiang, 2008; Zhang, 2015). 한국어와 관련된 연구로는 Chang(2010, 2011, 2012, 2013), Kim(2019), Cho(2023)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Chang은 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파열음의 VOT와 후행모음의 F0, 포먼트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가설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한국어를 처음 접한 미국인이 학습 2주 차에 모국어의 파열음 VOT와 후행모음의 F0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2언어습득의 초기 단계에서도 제1언어의 음향적 편차(acoustic deviation)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제2언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제1언어의 음성 특징이 가장 강력하게 동요한다는 신기 효과(novelty effect)를 제기하였다. 둘째로 제2언어가 제1언어에 미치는 영향은 음소 대 음소와 같이 개별적인 층위가 아니라, 음운 체계 층위(systemic level)에서 작동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Chang(2010)과 Guion(2003)의 연구에서 이중언어자의 제1언어 모음들은 제1포먼트(first formant, F1) 값이 전반적으로 하강하였다. 모음의 F1 하강은 모음사각도에서 그 위치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Chang은 이 현상을 제1언어 모음의 체계적 상승(the systemic rising of L1 vowel) 이라 명명하였다. 두 연구에서 이중언어자가 학습한 제2언어 모음 목록에는 제1언어 모음 목록보다 적은 수량의 중저모음이(mid & low vowel) 분포한다. 중저모음은 고모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F1 값을 가진다. 이에 따라 Chang은 제2언어습득 과정에서 두 언어의 모음 목록 간 F1 값의 차이가 제1언어 모음의 체계적 상승을 유발한 것이라 주장한다. Chang이 주장한 개념들은 아직 다양한 언어의 실증 연구를 통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화되지 않았던 제1언어에 대한 제2언어의 여러 가지 음성적 효과에 대해 이론적인 정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치조마찰음을 습득한 뒤, 제1언어와 제2언어 사이에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데 있다. 그중 제1언어에 대한 제2언어의 간섭 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국어의 평마찰음과 경마찰음은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유무성의 대립없이 공존하는 음소이기 때문에,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에게는 습득 난이도가 높은 발음이다. 특히 표준중국어에는 한국어의 두 치조마찰음과 조음 위치에서 대응하는 소리가 /s/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두 마찰음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다. 과거 제2언어의 음성 간섭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음의 길이, 모음의 F0과 포먼트 등의 음향 단서들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는 제1언어에 대한 제2언어의 영향이 다양한 음향 단서에서 출현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마찰음의 주파수 무게중심과 발성유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치음 계열 마찰음은 발성유형에 따라 평음 /sh/과 경음 /s*/ 두 종류가 존재한다. 두 마찰음은 모두 무성음이며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발음하지만, 성문의 압력 차이가 존재한다. 경음은 조음 과정에서 평음보다 성문하압(subglottal pressure)이 높고, 이와 동시에 전강(front oral cavity)의 압력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평음은 성문이 약간 개방된 상태에서 발음하기 때문에, 성문하압이 상대적으로 낮다. 기식 구간(aspiration)의 출현 유무 역시 두 마찰음 간 중요한 음성적 차이다. 경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마찰 소음(friction)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평음은 마찰 소음과 모음의 시작 지점 사이에 뚜렷한 기식 구간이 출현한다(Shin, 2015:238-239). 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경마찰음에서도 짧은 기식 구간이 관찰되기도 한다. Yoon(2002)에서 경음 /s*a/는 13 ms의 기식 구간이 출현한다. 기류가 성도의 장애물과 부딪히거나 마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소음과 다르게, 기식 소음은 성도의 좁은 틈을 빠져나가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스펙트로그램에서 마찰 구간의 소음은 고주파 영역에 집중되지만, 기식 구간의 소음은 상대적으로 중저주파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고모음 /i/가 후행할 때, 두 치조마찰음은 치조경구개음 /ɕhi/와 /ɕ*i/로 실현된다. Shin(2015:242-243)에 따르면 경음 /s*/와 /ɕ*/는 소음 에너지의 분포에서 차이가 있는데, 후자는 전자에 비해 훨씬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소음 에너지가 집중된다. 평음 /ɕhi/의 경우 기식성이 약화되면서 음향적으로 경음 /ɕ*i/와 가까워진다. Yoon(2002)에서 평음 /sh/는 /a/ 모음 앞에서 69 ms의 기식 구간이 출현하지만, /i/모음 앞에서는 기식 구간이 7 ms로 감소한다.
표준중국어 음운체계에는 /s/와 /ɕ/ 두 종류의 치음 계열 마찰음이 존재한다. 두 마찰음 모두 무성음이며, 한국어 마찰음과 마찬가지로 후행모음에 따른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다. /ɕ/는 전설 고모음 /i, y/가 선행하는 조건에서만 출현하고, 그 외 다른 모음 조건에서는 모두 /s/가 출현한다(s > ɕ /___{i,y}). Eom(2016:101-102)에 따르면 표준중국어의 /s/는 한국어의 치조마찰음보다 약간 앞쪽에서 조음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혀끝을 앞니에 붙여 발음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표준중국어 /s/는 치음으로, /ɕ/는 치조경구개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표준중국어 /s/는 기식 구간이 출현하지 않으며 성문의 긴장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한국어 경마찰음과 유사한 점이 있다. Yu(2008)는 한중 마찰음의 음향 특징을 대조하여 표준중국어 /s/의 길이가 한국어 경음 /s*/과 상당히 가깝지만, 평음 /sh/과는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주파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은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에너지가 집중되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주파수 무게중심은 음성 연구에서 마찰음의 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음향 단서 중 하나이다. 주로 마찰음 조음 시 전강(front oral cavity)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구강의 앞쪽에서 혀의 좁힘이 일어나 전강이 좁아지면 주파수의 무게중심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구강의 뒤쪽에서 혀의 좁힘이 일어나 전강이 넓어지면 주파수의 무게중심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진다(Forrest et al., 1988; Gordon et al., 2002; Jongman et al., 2000). 주파수 무게중심은 한국어의 평마찰음과 경마찰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음향 단서를 제공한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경마찰음의 주파수 무게중심이 평마찰음보다 높다고 보고한다. Lee(2017)의 음향 분석에 따르면 평마찰음과 경마찰음의 주파수 무게중심 평균은 각각 6,236 Hz과 7,724 Hz로 나타난다. Cho et al.(2002), Sung & Cho(2010)에서도 경마찰음의 주파수 무게중심 값은 평음보다 높다. Cho et al.(2002)은 두 마찰음을 발음할 때 성도를 빠져나가는 제트 기류의 속도 차이가 주파수 무게중심 값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제트 기류의 속도 차이는 전강의 크기와 성문하압에서의 차이와(경음>평음)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Lee(2017)은 평마찰음, 평파찰음, 격파찰음의 기식 구간을 분석하여 이들 자음의 기식 구간에서 주파수 무게중심의 상당한 감소와 하강(falling)하는 스펙트럼 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평마찰음에서 기식 구간의 주파수 무게중심은 평균 3,545 Hz로 경마찰음의 7,049 Hz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표준중국어의 두 마찰음 간 전강의 크기와 조음 위치에서 차이 역시 주파수 무게중심 값의 차이로 나타난다. Svantesson(1986)의 표준중국어 마찰음의 주파수 무게중심 분석에 따르면 /s/의 평균은 6,006 Hz로 평균 5381 Hz의 /ɕ/보다 더 높다. Lee(2011)에서도 /s/와 /ɕ/의 주파수 무게중심 평균은 각각 9,020 Hz와 7,009 Hz로 전자에서 더 높은 주파수 무게중심 값이 나타난다.
발성유형(phonation type)은 조음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대의 포괄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자음의 발성유형 연구는 후행모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로 생리적 분석과 음향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자성문파형검법(electro glotto graphy, EGG)이 있다. 후자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분석법이다. 여러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첫번째 배음(first harmonic, H1)과 두번째 배음(second harmonic, H2)의 진폭차(dB)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Stevens(1977)은 두 배음 간 진폭차를 이용하여 말소리의 스펙트럼 특성을 정량화하였다. H1-H2 값은 성문의 개방지수(open quotient)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H1-H2 값이 클수록 성대가 느슨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기류가 새어나간다는 사실을 반영하는데, 이는 해당 발음의 발성유형이 숨섞인 소리(breathy voice)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H1-H2 계산법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에, 만약 어떤 소리의 H1-H2 값이 크다고 해서 그 소리가 반드시 숨섞인 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두 음소의 비교를 통해 발성유형 특징을 상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한국어 치조마찰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마찰음의 후행모음에서 경마찰음보다 더 높은 성문 개방지수가 나타난다. Lee(2017)은 두 마찰음의 후행모음 시작부분에서 H1-H2 값을 측정하였는데, 경마찰음과 평마찰음의 평균은 각각 5.16 dB와 12.05 dB로 나타났다. Cho et al.(2002) 역시 후행모음의 시작부분에서 평마찰음의 성대 개방지수가 경마찰음보다 유의미하게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이는 모음의 중간부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두 치조마찰음의 발성유형적 차이가 주로 후행모음의 시작부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평마찰음의 후행모음에서는 숨섞인 소리에 가까운 발성 특징이 나타나고, 경마찰음의 후행모음은 성대에 압박이 가해지는 발성(pressed phonation) 특징을 담고 있다.
2. 연구방법
본문에서는 한국어와 표준중국어 치음 계열 마찰음에 대해 산출 실험을 실시한다. 우선 한국어 분석을 통해 제2언어로서 한국어 마찰음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산출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표준중국어 마찰음에 대해 단일언어자와 중국 학생들의 대조 분석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음향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단일언어자와 제2언어 학습자가 간 음향 차이가 클수록 제2언어에 의한 간섭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단일언어자와 중국 학생들 간 유의미한 음향 차이가 발견된다면, 한국어의 산출 특징에 근거하여 중국 학생들의 제1언어 음향 편차와 한국어 습득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36명의 피험자가 산출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는 크게 한국어 단일언어자(Korean monolingual, KM), 중국어 단일언어자(Mandarin monolingual, MM),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세 집단이다. KM과 MM은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군으로서 각 집단 간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남녀 성비는 5:5이다(M=28.7, SD=3.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다시 한국어 학습 기간과 수준에 따라 초급학습자(beginning Korean speakers, BKS)와 고급학습자(advanced Korean speakers, AKS)로 나눈다. 전자(BKS)는 중국 푸단대학교(Fudan University) 한국어과 1, 2학년 학부생이다. BKS 구성원들은 대학교 입학과 함께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없다. 여성 10명과 남성 2명, 총 12명이 참가하였다(M=19.8, SD=0.8). 후자(AKS)는 한국 체류 및 한국어 학습 기간이 평균 5년이 넘으며, 녹음 당시 한국에서 학업 혹은 근무를 하고 있었다. AKS의 모든 구성원은 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과 유창한 소통이 가능하다. BKS와 동일하게 여성 10명과 남성 2명, 총 1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M=29.6, SD=4.4). 실험 전 한국어와 중국어 외 다른 언어 요소의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통하여 녹음 희망자 개개인의 언어 배경을 조사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외 다른 언어 요소의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였다. 게다가 중국인 피험자의 경우(MM, BKS, AKS) 방언 변수를 줄이기 위하여 표준중국어를 제1언어로 구사하며,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능숙하지 못한 사람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어떠한 언어 장애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어와 표준중국어의 2음절 어휘를 실험자료로 사용하였다(표 1). 목표 음절(target syllable)은 첫번째 음절이다. 목표 음절의 어두 자음 위치에 치음 계열 마찰음을 배치하고, 후행모음으로 저모음 /a/와 고모음 /i/를 삽입하였다. 표준중국어의 경우 성조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여, 목표 음절의 성조 높은 수평조(high-level tone, Tone1)와 높은 내림조(high-falling tone, Tone4)로 설정하였으며 동시에 두번째 음절의 성조는 높은 수평조로 통일하였다(표 2). 실험자료는 모두 실질적 의미를 갖는 단어로 구성하였다.
| 마찰음 종류 | 모음 | |
|---|---|---|
| /a/ | /i/ | |
| 평음 /sh/ | 사다 /sha.ta/ 사고 /sha.ko/ |
시다 /ɕhi.ta/ 시도 /ɕhi.to/ |
| 경음 /s*/ | 싸다 /s*a.ta/ 싸늘 /s*a.nɯl/ |
씨름 /ɕ*i.lɯm/ 씨족 /ɕ*i.tɕok/ |
| 성조 | 모음 | |
|---|---|---|
| /a/ | /i/ | |
| Tone1+Tone1 | 塞车 /sai.tʂʰə/ (차가 막히다) |
瞎说 /ɕia.ʂuo/ (헛소리하다) |
| Tone4+Tone1 | 赛车 /sai.tʂʰə/ (자동차 경주) |
下单 /ɕia.tan/ (주문하다) |
주파수 무게중심과 발성유형을 음향 단서로 분석한다. Jongman et al.(2000)은 마찰음을 시작, 중간, 종료 구간과 모음 전이 구간(vowel transition)의 네 부분으로 나눈 뒤, 각 부분의 40 ms 구간에서 주파수 무게중심을 측정하였다. 이번 연구는 Jongman et al.(2000)의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마찰음의 시작, 중간, 종료 구간에서 주파수 무게중심을 측정하고자 한다. 마찰음을 세 구간으로 나눈 것은 한국어 평마찰음의 기식 구간이 주파수 무게중심 측면에서 마찰 구간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기식 구간의 특징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과 제1언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찰하기 위함이다. 세 구간은 각각 마찰음의 25, 50, 75% 지점을 기준으로 앞뒤 10 ms를 포함하는 총 20 ms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푸리에 변환을 통해(fast Fourier transform, FFT) 각 구간에 대한 파워스펙트럼(power spectrum)을 만들어 낸 뒤 주파수 무게중심을 측정하였다.
발성유형 분석은 H1-H2 값을 측정한다. 어두 자음의 발성유형 분석은 일반적으로 후행모음에서 이뤄진다. 특히 모음의 시작부분은 거리적 근접성 때문에 선행자음의 발성유형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에 따라 H1-H2 분석은 각 모음의 25% 지점에서 실시하였다. 한편 고모음에서는 저모음에 비해 불안정한 H1-H2 값이 나타나기 쉽다. H1은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와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는데, 고모음(특히 /i/ 모음)의 높은 기본주파수 값은 H1-H2 값 측정에 영향을 주어 종종 왜곡된 결과값을 발생시킨다. 이번 연구는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자료 중 저모음 /a/가 후행하는 단어만을 대상으로 H1-H2 값을 측정한다. 두 음향 단서의 측정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onset, midset, offset은 각각 마찰음의 시작, 중간, 종료 구간으로, 이 세 구간에서 주파수 무게중심을 측정하였다. 이어지는 모음의 25% 지점에서는 H1-H2 값을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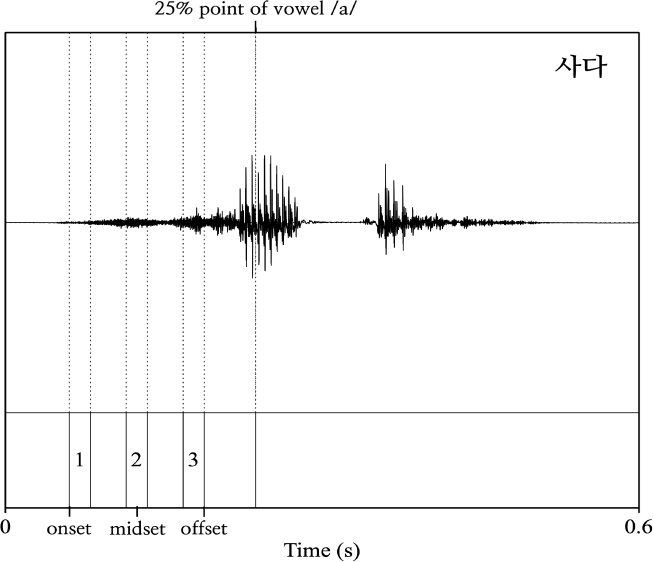
한국과 중국에서 산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MM과 BKS에 대한 실험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푸단대학교(Fudan University, Shanghai)의 음성 실험실에서 실시하였다. KM과 AKS에 대한 실험은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연구실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녹음은 AKG 사의 C544L 헤드셋 마이크(AKG Acoustics, Vienna, Austria)와 Focusrite 사의 Scarlett solo(1st Gen, Focusrite PLC, High Wycombe, UK)를 이용하여 4.41 kHz 샘플링 레이트와 16 bit 양자화로 기록하였다.
피험자에게 자연스러운 발화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모든 실험자료를 동일한 틀문장(carrier sentence)에 끼워 넣었다. 한국어 틀문장은 “이 단어는 OO 입니다”이고, 표준중국어 틀문장은 “uə tɕiaŋ OO san piɛn”(나는 OO을 세 번 말합니다)이다. 모든 피험자는 틀문장을 포함한 실험자료를 두 번씩 읽도록 지시받았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한 1,440개의 토큰을 얻었다(Korrean: 30 subject×8 word×2 repeat×2 context= 960 tokens; Mandarin: 30 subject×4 word×2 repeat×2 context= 480 tokens).
주파수(Hz)와 배음(dB) 값은 모두 praat(6142; Boersma & Weenink, 2021)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출하였다. R studio(4.4.2; R Core Team, 2024)를 통해 통계분석과 그래프를 제작하고, 통계기법으로는 분산분석(ANOVA)과 사후 검정으로 Bonferroni 교정을 사용하였다.
3. 분석
한국어 치조마찰음의 주파수 무게중심에 대한 KM, BKS, AKS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On, Mid, Off는 각각 마찰음의 시작구간, 중간구간, 종료구간을 가리킨다.
한국어 치조마찰음에 대한 세 집단 간 주파수 무게중심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7.144, p<.001). 그러나 이 차이는 후행 하는 모음에 따라 달라진다. 사후검정 결과 /a/ 모음 환경에서 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만(p<.05), /i/ 모음 환경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p=1.00). 우선 /a/ 모음이 후행 하는 환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2). 첫째로 세 집단 모두 평음 /sha/의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KM의 /sha/는 중간구간에서 무게중심 평균이 6,138 Hz, 종료구간이 1,967 Hz이다. 종료 구간은 기식성으로 이뤄진 구간으로 무게중심의 급격한 감소는 기식성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사후검정 결과 KM 마찰음의 두 구간 간 무게중심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다. AKS 역시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이 급감한다. 중간구간과 종료구간의 평균은 각각 4,352 Hz와 1,829 Hz이며, 두 구간 간 무게중심 차이는 상당히 유의하다(p<.001). 한편 중간구간과 종료구간에 대한 BKS의 무게중심 평균은 각각 5,064 Hz와 3,471 Hz로, 다른 두 집단과 마찬가지로 종료구간에서 평균이 감소한다. 그러나 두 구간 간 무게중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1.00). 둘째로 두 학습자 집단은 경음 /s*a/의 종료구간에서도 무게중심이 감소한다. AKS의 무게중심 평균은 중간구간이 6,675 Hz, 종료구간이 4,562 Hz이다. 두 구간 간 무게중심 차이는 2,113 Hz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다. BKS의 무게중심 역시 커다란 감소폭을 보인다. 중간구간과 종료구간의 무게중심 평균이 각각 7,116 Hz와 5,178 Hz로 1,938 Hz의 차이가 있다. 두 구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다(p<.001). 두 학습자 집단과 달리 KM의 경음 /s*a/는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이 감소하지 않으며, 중간구간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p=1.00)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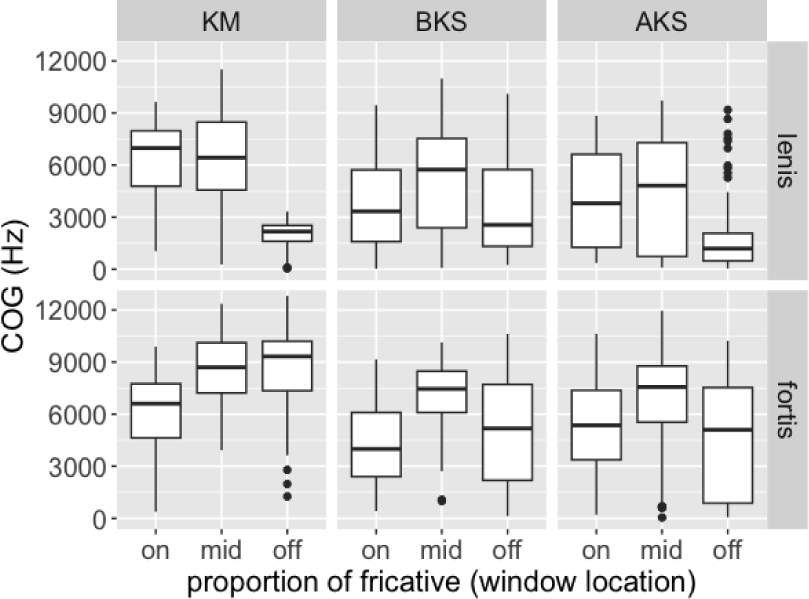
한편 /i/ 모음 환경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주파수 무게중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1.00). 사후검정 결과 모든 조건에서(two fricative categories, three position) 세 집단 간 무게중심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p=1.00). /a/ 모음 환경과 비교하여,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세 집단 모두 중간구간에 비해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 평균이 약간 감소하였지만, 이 두 구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다(p=1.00). 이는 /i/ 모음 앞에서 평음의 기식성이 거의 사라지거나 약화 되면서 무게중심 측면에서 경음 /ɕ*i/와 유사해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통계적으로도 세 집단 모두 평음 /ɕhi/와 경음 /ɕ*i/의 무게중심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1.00).
이 장에서는 표준중국어 치음 계열 마찰음 /sai/와 /ɕia/의 주파수 무게중심을 분석한다. MM, BKS, AKS의 표준중국어 마찰음 주파수 무게중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준중국어 마찰음의 주파수 무게중심에 대한 세 집단의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다(F=16.826, p<.001). 세 집단과 두 단어 간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세 집단과 두 단어와 세 위치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F=2.072, p=.082). 세 집단 간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sai/의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 감소 여부이다. MM은 중간구간과 종료구간의 무게중심 차이가 평균 467 Hz로 감소폭이 작다. 그러나 두 학습자 집단은 모두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의 평균값이 1,000 Hz 이상 감소한다. /sai/의 종료구간에서 두 학습자 집단의 무게중심 감소폭이 MM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사후검정 결과 MM은 중간구간과 종료구간의 무게중심 차이가 유의하지 않지만(p=1.00), 두 학습자는 모두 두 구간 간 무게중심 차이가 매우 유의하다(p<.001). 한편 /ɕia/에서는 세 집단과 세 위치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F=1.084, p=.363), 세 집단 간 의미 있는 무게중심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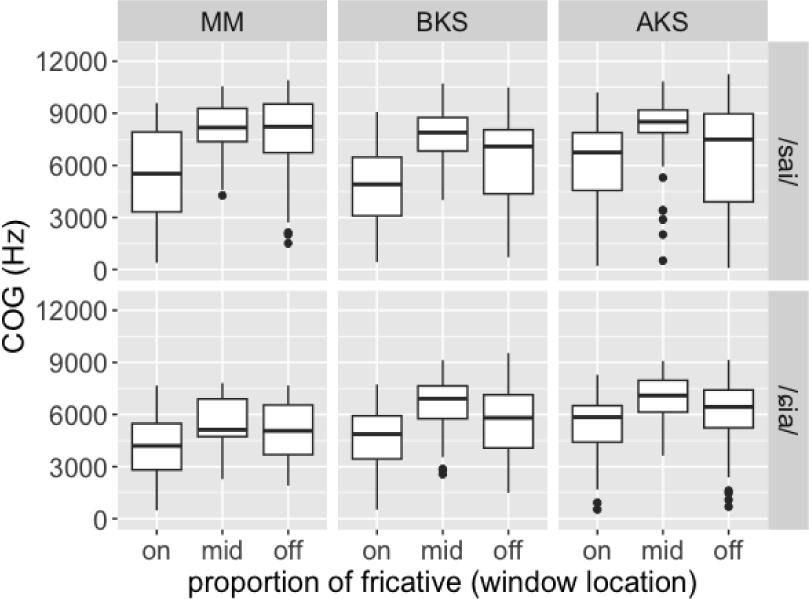
이상 두 언어의 주파수 무게중심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KM의 평음 /sha/는 기식성으로 이뤄진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이 급감하였다. Lee(2017)의 연구 결과와 같이, /sha/에서 출현한 무게중심의 감소는 기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기식성이 거의 출현하지 않는 /ɕhi/와 경음의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의 뚜렷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무게중심 감소와 기식성의 연관성을 뒷받침해준다. 둘째, 두 학습자 집단도 제2언어 한국어 평음 /sha/의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이 감소한다. 이는 이들이 평음 /sha/의 기식 구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발화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두 학습자 집단은 경음 /s*a/의 종료구간에서도 무게중심의 뚜렷한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평음의 기식 구간을 과도하게 의식한 결과 과잉교정(hypercorrection)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 감소가 두 학습자 집단의 제1언어 표준중국어 마찰음에서도 관찰되었다. 두 학습자 집단은 /sai/의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ɕia/의 종료구간에서는 두드러진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MM은 /s/의 종료구간에서 무게중심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한국어 치조마찰음 후행모음의 H1-H2에 대한 KM, BKS, AKS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 집단 | 평음 /sha/ | 경음 /s*a/ |
|---|---|---|
| KM | 4.11 (2.58) | 2.05 (2.88) |
| BKS | 6.14 (3.11) | 6.37 (3.41) |
| AKS | 6.6 (4.29) | 5.49 (4.72) |
한국어 치조마찰음의 H1-H2에 대한 세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다(F=.26.116, p<.001). 세 집단과 두 마찰음 간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다(F=3.362, p<.05). 사후검정 결과 한국어 화자의 H1-H2가 두 학습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지만(p<.001), 두 학습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01). 한편 평음과 격음 간 차이에서 KM은 두 마찰음 간 H1-H2의 차이가 유의하지만(p<.001), 두 학습자 집단은 모두 두 마찰음 간 H1-H2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1.00). 이 결과는 KM은 발성유형 측면에서 두 마찰음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발음하지만, 두 학습자 집단은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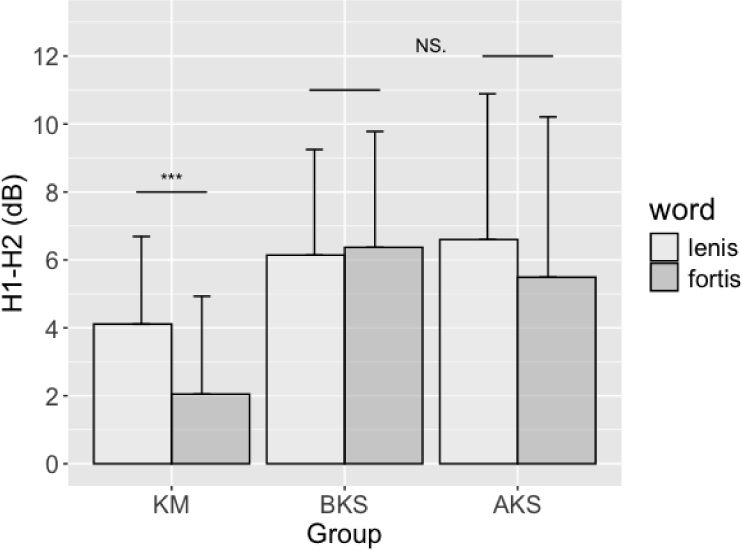
표준중국어 /sai/에 대한 MM, BKS, AKS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 집단 | 평균 | 표준편차 |
|---|---|---|
| MM | 0.85 | 2.88 |
| BKS | 4.81 | 2.41 |
| AKS | 2.26 | 3.7 |
표준중국어 /sai/에 대한 세 집단 간 H1-H2의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다(F=30.96, p<.001). BKS의 평균이 4.81 Hz로 가장 크고, MM이 0.85 Hz로 가장 작다. AKS는 2.26 Hz로 두 집단의 중간값이다. 사후검정 결과 BKS와 나머지 두 집단 간 H1-H2의 차이는 상당히 유의하다(p<.001). AKS와 MM 간 H1-H2의 차이 역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다(p<.05). 이를 통해 MM과 비교하여 두 학습자 집단의 H1-H2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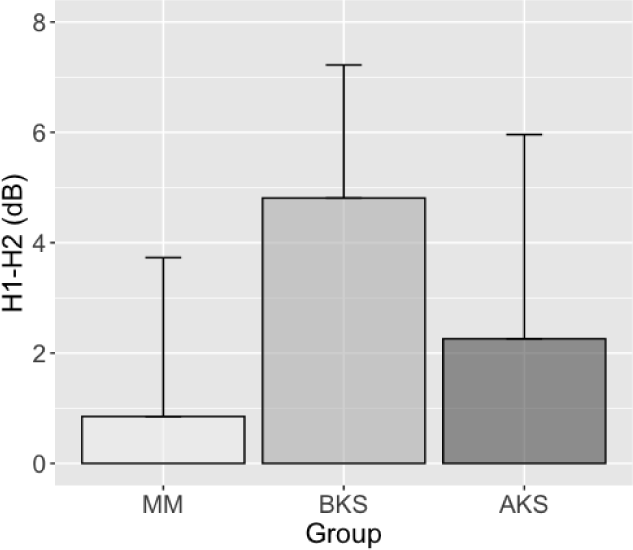
이상 H1-H2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마찰음에서 두 학습자 집단의 H1-H2는 KM보다 더욱 크다. 둘째, 두 학습자 집단은 KM과 다르게 한국어 평음과 경음 간 H1-H2의 차이가 거의 없다. 즉, 발성유형 측면에서 두 학습자 집단은 제2언어로서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을 잘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다. 셋째, 표준중국어 마찰음 /sai/에서 두 학습자 집단과 MM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두 학습자 집단은 모두 MM보다 큰 H1-H2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BKS의 H1-H2는 MM과 AKS보다 크게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이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드러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단일언어자 간 음향 차이와 한국어 학습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표준중국어의 주파수 무게중심과 H1-H2 분석을 통해 제1언어 표준중국어 마찰음에 대한 제2언어 한국어의 간섭 효과를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를 발견하였다.
첫째로 표준중국어의 두 가지 음향 단서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단일언어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음향적 차이는 학습자의 음향 단서가 단일언어자의 기준에서 점차 멀어지는 양상으로 표현되었다. 학습자는 /sai/의 종료구간에서 주파수 무게중심 값의 감소가 두드러졌지만, 단일언어자는 이러한 감소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찰음 후행모음의 H1-H2 분석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단일언어자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둘째로 표준중국어 마찰음에서 나타난 한국어 학습자와 단일언어자 간 음향 차이에는 한국어 마찰음의 음성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제2언어 한국어 평마찰음의 종료구간에서 주파수 무게중심 값이 감소하는 특징을 한국인 단일언어자와 유사하게 표현해냈다. 이는 평마찰음의 기식성을 잘 인지하고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감소 현상이 학습자의 제1언어인 표준중국어 /sai/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반면, 단일언어자에게는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언어로서 한국어 습득이 제1언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습자와 단일언어자 간 표준중국어 H1-H2 값의 차이 역시 한국어 마찰음 습득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번 실험에서 두 언어 단일언어자들 간 마찰음 후행모음의 H1-H2 평균값을 대조해보면, 한국어 평음과 경음이 각각 4.11 dB와 2.05 dB이고, 표준중국어가 0.85 dB로 나타났다. 세 마찰음 간 H1-H2 값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 발성유형 측면에서 한국어 마찰음의 후행모음은 시작부분에서 숨섞인 소리에 가까운 특징을 담고 있으며, 표준중국어는 상대적으로 성대에 압력이 가해지는 발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두 언어 마찰음의 발성유형 차이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제1언어 모음에서 발견된 높은 성문 개방지수는 한국어 마찰음, 특히 평음의 발성 특징이 학습자의 제1언어 마찰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초급학습자의 H1-H2 값이 고급학습자보다 훨씬 커진 현상에 대해서는 Chang(2013)이 언급한 신기 효과(noverlty effect)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단일언어자와 음향적 차이가 초급학습자와 고급학습자 집단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게다가 마찰음 종료구간에서 주파수 무게중심 값의 감소와 H1-H2 값의 증가라는 변화의 방향성까지도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일언어자에게는 출현하지 않는 음성적 특징을 두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음향적 이탈이 한국어 습득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이번 실험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게서 발견된 제1언어에 대한 제2언어의 간섭 효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음소 대응 관계 속에서 더욱 큰 음향적 차이를 가진 음소 사이에서 강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한국어는 평음과 경음이라는 두 가지 치조마찰음이 있지만, 표준중국어는 동일조음 위치에 /s/ 하나만 존재한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치조마찰음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평음과 경음을 모두 제1언어 /s/에 대응시키는 이른바 다대일 대응관계(many to one mapping)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즉,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동안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체계 내부에서는 한국어의 두 가지 마찰음과 표준중국어의 /s/가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앞선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제1언어 마찰음에 반영된 것은 주로 한국어 평음의 음성적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대일 대응관계 속에서 제2언어 평음과 제1언어 /s/ 간 더욱 강력한 상호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평음이 경음보다 표준중국어 /s/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원인은 대응하는 소리 간 음성적 차이에 기인했을 것이다. 모음 /a/가 후행하는 경우 한국어 경음과 표준중국어 /s/는 음향적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평음은 기식 구간의 출현으로 인해 표준중국어 /s/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반대로 /i/ 모음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제1언어 마찰음에 유의미한 음향적 편차가 없었던 원인은 대응하는 소리 간(/ɕhi/, /ɕ*i/-/ɕi/) 뚜렷한 음성적 차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Flege(1987)가 제기한 제2언어습득의 청지각적 연결(perceptual linkage) 관계에서 제2언어의 유사한 소리(similar sound)보다 새로운 소리(new sound)를 습득할 때, 대응하는 제1언어의 음소가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로 제1언어에 대한 제2언어의 간섭 효과가 제2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음향적 편차는 제2언어의 후기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Chang(2013)은 이미 종적연구를 통해 제2언어의 간섭 효과가 제2언어 습득 초기에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8주라는 실험 기간의 한계 때문에, 학습자들이 제2언어 습득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을 경우 제1언어의 음향적 편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혹은 단일언어자의 음향적 기준으로 다시 회복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번 실험에서는 초급학습자와 고급학습자를 함께 관찰하여 제2언어습득 초기 단계에서 제1언어의 음향적 편차가 발생 가능하며, 이 시기 발생한 음향 편차는 제2언어습득 후기 단계에서도 유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제1언어의 음향 편차가 비몰입(non-immersion) 환경, 즉, 모국어 사용 환경에서 제2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도 발생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제2언어 간섭 효과에 관한 연구는 피험자들이 실험 당시 몰입 환경에서 제2언어를 습득하고 있거나, 이전에 몰입 환경에서 제2언어를 습득한 경험이 있었다. 비몰입 환경에서 제2언어에 대한 노출은 당연히 몰입 환경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비몰입 환경에서 제2언어를 학습하는 초급학습자들의 제1언어에서 유의미한 음향 편차를 관찰하였다. 이는 제1언어 음향 편차가 제2언어의 절대적인 노출양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제2언어의 입력이 있다면 충분히 발생 가능한 현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 이 연구는 제2언어습득 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제1언어에 대한 제2언어의 간섭 효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치음 계열 마찰음에 대하여 음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제1언어가 단일언어자의 음향 기준에서 다소 멀어졌으며, 동시에 한국어 마찰음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한국어와 표준중국어 간 제2언어 간섭 효과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더 다양한 음소와 음향 단서를 분석하지 못한 점, 지각 실험이 부재한 점 등은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